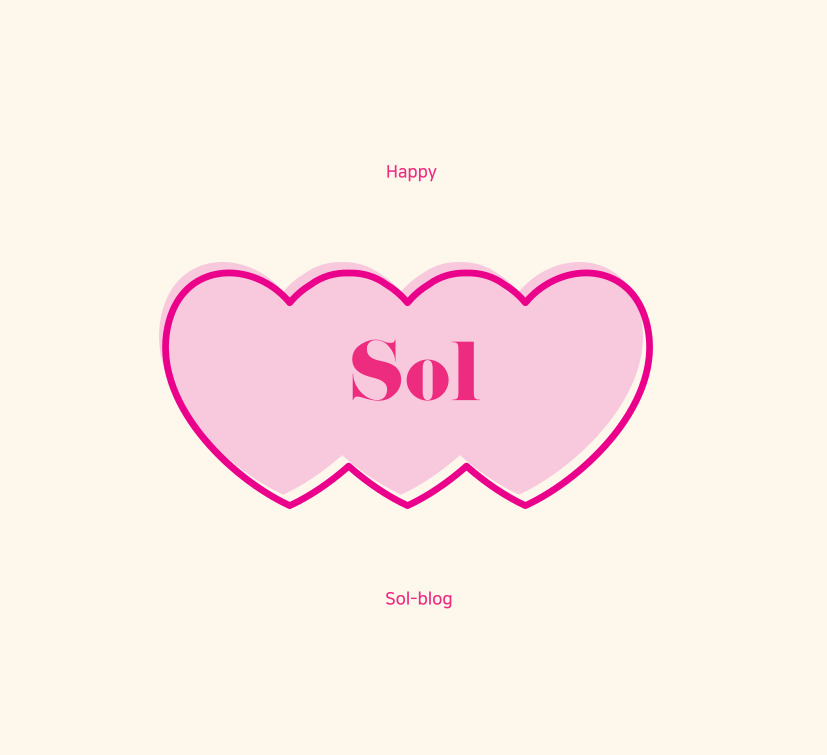-
목차
반응형뇌졸중 환자의 마취 관리: 마취가 뇌 혈류에 미치는 영향
1. 뇌졸중 환자의 병태 생리와 마취의 기본원칙
뇌졸중은 뇌혈류의 급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으로, 크게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으로 구분됩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혈전(thrombus) 또는 색전(embolus)에 의해 폐색 되면서 뇌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됩니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은 고혈압이나 혈관 기형 등에 의해 혈관이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출혈로 인해 두개내압이 상승하고 주변 뇌조직이 압박을 받으며 손상이 진행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뇌졸중 모두 뇌혈류 조절과 두개내압 관리가 핵심이며, 마취 관리 중 혈역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뇌혈류는 뇌혈류 자동 조절 기능(cerebral autoregulation)에 의해 조절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평균 동맥압(MAP, mean arterial pressure)이 50~150mmHg 범위 내에서 유지되면 뇌혈류는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는 이 자동 조절 기능이 손상되어 혈압이 조금만 변해도 뇌혈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압이 낮아지면 허혈 부위로 가는 혈류가 더욱 감소하여 뇌손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취 중 평균 동맥압(MAP)을 70-100mmHg 수준으로 유지하여 뇌관류압(CPP, cerebral perfusion pressure)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혈성 뇌졸중 환자는 고혈압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출혈 위험이 높아지므로, 혈압을 신중하게 조절하면서도 과도한 저혈압을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혈성 뇌졸중 환자는 MAP을 110mmH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는 뇌조직의 괴사 또는 출혈로 인해 뇌부종(cerebral edema) 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뇌부종이 심해지면 두개내압(ICP, intracranial pressure)이 상승하여 뇌허혈을 더욱 악화시키고, 심한 경우 뇌탈출(herniation)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취 시 두개내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뇌혈관 확장 작용이 강한 흡입 마취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두개내압을 증가시키지 않는 정맥 마취제의 사용이 선호됩니다. 흡입 마취제 중 이소플루란(isoflurane), 세보플루란(sevoflurane), 데스플루란(desflurane) 은 모두 뇌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 두개내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보플루란은 상대적으로 뇌혈류 증가 효과가 적고 혈역학적으로 안정적이므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개내압이 높은 환자에게는 가능한 한 정맥 마취제(TIVA, total intravenous anesthesia)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정맥 마취제 중 프로포폴(propofol) 은 뇌혈류와 두개내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뇌졸중 환자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은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압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저용량으로 사용하고, 필요시 혈압 상승제를 병행해야 합니다. 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혈역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저혈압이 우려되는 환자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부신 기능 억제 부작용이 있어 장기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케타민(ketamine) 은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두개내압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뇌부종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마취 관리: 마취가 뇌 혈류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뇌졸중 환자의 마취 관리에서는 혈압과 뇌관류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두개내압 상승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마취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도록 마취 유도 및 기관 내 삽관 시 적절한 혈압 조절 전략을 적용하고, 마취 유지 중에도 지속적인 혈압 모니터링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뇌부종을 줄이기 위해 만니톨(mannitol) 또는 고장성 식염수(hypertonic saline) 등의 삼투성 이뇨제를 고려하고, 필요시 과호흡(hyperventilation) 전략을 적용하여 두개내압을 조절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마취에서는 혈압과 뇌관류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뇌부종 및 두개내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마취제 선택과 혈역학적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철저한 평가와 맞춤형 마취 전략을 통해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마취 전 평가 및 준비
뇌졸중 환자의 마취 전 평가에서는 신경학적 상태, 혈역학적 상태, 호흡 기능, 전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환자의 신경학적 기능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마취 전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철저히 평가하고 최적의 마취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신경학적 평가
뇌졸중 환자의 마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기저 신경학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신경학적 평가를 통해 의식 수준, 운동 기능, 뇌신경 기능, 감각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Glasgow Coma Scale(GCS)을 활용하여 환자의 의식 상태를 평가하며,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마취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출혈로의 전환(hemorrhagic transformation)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혈성 변환이 발생하면 뇌부종과 두개내압 상승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마취 중 혈압 변동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혈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뇌졸중 발생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중요합니다. 급성기(뇌졸중 발생 후 24~48시간 이내)에는 뇌부종과 혈압 변동이 심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마취를 진행할 경우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급성기가 지난 후 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혈역학적 평가
뇌졸중 환자의 혈압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저혈압이 발생하면 허혈 부위로 가는 혈류가 더욱 감소하여 뇌경색이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 환자는 고혈압이 지속될 경우 출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취 전 평균 동맥압(MAP)과 뇌관류압(CPP)을 최적의 범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보통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MAP을 70~100mmHg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출혈성 뇌졸중 환자는 MAP을 110mmHg 이하로 조절하여 추가 출혈을 방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자율신경 기능 이상(dysautonomia)이 있는 경우 혈압 변동이 심할 수 있으므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혈관 작용제(vasoactive agents) 및 적절한 수액 요법이 필요합니다.
3) 호흡 기능 평가
뇌졸중 환자는 의식 저하 및 근력 약화로 인해 기도 반사 및 호흡 조절 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수(medulla)가 손상된 경우, 호흡 조절에 문제가 생겨 호흡 부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취 전 환자의 기도 반사(aspiration risk), 호흡 능력, 산소 포화도(SpO₂) 및 이산화탄소(CO₂) 저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관 삽관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기관절개술(tracheostomy)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환자는 폐렴 위험이 높으므로 마취 전 흡인성 폐렴 예방을 위해 위 내용물 제거 및 적절한 항생제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4) 기타 전신 평가
뇌졸중 환자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신부전 등 다양한 기저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심혈관 질환(심방세동, 허혈성 심질환 등)으로 인한 색전증이므로, 심장 초음파(Echocardiography) 및 심전도(ECG) 검사를 통해 심장 기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신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조영제 사용 및 특정 마취제 투여에 주의해야 하며, 간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마취제의 대사 및 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약물 선택이 필요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마취 관리: 마취가 뇌 혈류에 미치는 영향 3. 마취 유도 전략
뇌졸중 환자의 마취 유도 과정에서는 저혈압을 방지하고, 두개내압 상승을 최소화하며, 신경학적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마취 유도 시 과도한 혈압 강하가 발생하면 허혈 부위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을 서서히 조절하며 마취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마취 유도제 선택
마취 유도제는 혈역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두개내압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 프로포폴(propofol): 뇌혈류 및 두개내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선호됩니다. 그러나 과량 투여 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용량(1~2mg/kg)으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 에토미데이트(etomidate): 혈역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저혈압이 우려되는 환자에서 유용합니다. 그러나 부신 기능 억제 효과가 있어 장기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 케타민(ketamine): 혈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두개내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 두개내압이 높은 환자에서는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2) 근이완제 선택
기관 내 삽관을 위해 근이완제를 사용할 때는 뇌압 상승 효과가 있는 약물과 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로쿠로늄(rocuronium): 비교적 안전하며, 적절한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 시스아트라쿠리움(cisatracurium): 신장 및 간 대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3) 기관 내 삽관 및 기도 관리
기관 내 삽관(intubation) 과정에서 혈압과 두개내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삽관 전 리도카인(lidocaine) 1.5mg/kg을 투여하면 기도 반사로 인한 두개내압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에스몰롤(esmolol)이나 레미펜타닐(remifentani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 삽관 후에는 적절한 산소 공급을 유지하고, PaCO₂를 35~40mmHg 수준으로 유지하여 과도한 이산화탄소 저류로 인한 뇌혈관 확장을 방지해야 합니다. 필요시 적절한 환기 전략을 적용하여 두개내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마취 유도 과정에서는 혈압과 두개내압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신경학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며, 환자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4. 마취 유지 (Maintenance) 전략
뇌졸중 환자의 마취 유지 단계에서는 뇌혈류의 안정적인 공급과 두개내압 조절이 핵심 목표입니다. 마취 유지 방법으로는 흡입 마취제(Inhalation Anesthetics) 또는 정맥 마취제(TIVA, Total Intravenous Anesthesia)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식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흡입 마취제(Inhalation Anesthetics) 선택
흡입 마취제는 뇌혈류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허혈성 뇌졸중인지, 출혈성 뇌졸중인지에 따라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과도한 뇌혈관 확장을 피해야 하므로 혈역학적 안정성이 높은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 환자는 두개내압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보플루란(Sevoflurane)
세보플루란은 혈역학적 안정성이 뛰어나고, 뇌혈관 확장 효과가 비교적 적어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심혈관 억제 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고령 환자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보플루란도 용량이 증가하면 뇌혈관 확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최소유효농도(MAC)를 1.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데스플루란(Desflurane)
데스플루란은 빠른 회복이 가능하여 수술 후 신경학적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혈압 변동이 심할 수 있어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농도 변화 시 교감신경계 자극으로 인해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서서히 농도를 조절하면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소플루란(Isoflurane)
이소플루란은 뇌혈류 증가 효과가 강해 두개내압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두개내압이 높은 환자에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뇌혈류 자동조절 기능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어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신경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혈 부위의 혈류 공급이 중요한 경우 적절한 혈압 조절과 함께 낮은 농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마취 관리: 마취가 뇌 혈류에 미치는 영향 2) 정맥 마취제(TIVA,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선택
정맥 마취제(TIVA)는 흡입 마취제보다 뇌혈류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두개내압 조절이 용이하여 뇌졸중 환자에서 선호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두개내압이 높은 환자에서는 정맥 마취제를 중심으로 마취를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프로포폴(Propofol)
프로포폴은 뇌혈류 감소 효과가 있어 두개내압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두개내압이 높은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또한, 항경련 효과가 있어 뇌전증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량 투여 시 혈압 강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혈압이 있는 환자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 레미펜타닐(Remifentanil)
레미펜타닐은 빠른 대사가 이루어져 혈압 조절이 용이하며, 뇌혈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또한,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 수술 중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며, 마취 종료 후 빠르게 회복되어 신경학적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3) 혈역학적 안정성 유지 전략
뇌졸중 환자의 마취 유지 단계에서는 혈압 변동을 최소화하고, 뇌관류압(CPP, cerebral perfusion pressure)을 적절한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혈관 작용제(vasoactive agents)를 적절히 활용하여 평균 동맥압(MAP)을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저혈압이 발생할 경우
마취제 투여 중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허혈 부위로의 혈류 공급이 더욱 감소하여 신경학적 손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혈압이 발생하면 저용량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또는 페닐에프린(Phenylephrine)을 활용하여 평균 동맥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혈압이 발생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혈압이 상승하면 추가적인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에스몰롤(Esmolol)이나 라베타롤(Labetalol)과 같은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혈압을 급격히 낮추기보다는 서서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균 동맥압을 110mmH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 두개내압이 상승할 경우
두개내압 상승이 의심될 경우, 환기의 목표를 PaCO₂ 30~35mmHg 수준으로 유지하여 뇌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 시 만니톨(mannitol)이나 고장성 식염수(hypertonic saline)를 사용하여 뇌부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4) 마취 유지 중 환기 전략
마취 유지 중 적절한 환기 전략을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저산소증(Hypoxia) 예방
저산소증은 뇌 허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산소 공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FiO₂(흡입 산소 농도)를 40~60%로 유지하면서 적절한 산소화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PaCO₂ 조절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증가하면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두개내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PaCO₂를 30~35mmHg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도한 저탄산증(hypocapnia)은 뇌혈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절한 PEEP(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설정
너무 높은 PEEP은 정맥 환류를 방해하여 뇌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뇌졸중 환자에서는 PEEP을 5cmH₂O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마취 유지 단계에서는 혈압과 두개내압을 철저히 조절하면서 신경학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며, 환자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마취 관리 5. 마취 회복 및 수술 후 관리
뇌졸중 환자의 마취 회복 과정에서는 두개내압 상승을 방지하고, 뇌허혈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마취에서 회복되는 동안 혈압과 호흡이 급격히 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뇌혈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관 내 삽관 제거 시 혈압 상승, 기침 반사, 과도한 교감신경계 활성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술 후 신경학적 평가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뇌졸중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관내 삽관 제거(Intubation Extubation) 시 주의점
기관 내 삽관 제거 과정에서는 교감신경계 자극으로 인해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두개내압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발관(extubation)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약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펜타닐(Fentanyl)
펜타닐은 강력한 진통제이며, 교감신경계 반응을 억제하여 혈압 및 심박수 변화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삽관 제거 전 적절한 용량(1~2 mcg/kg)을 투여하면 기관 내 삽관 제거 시 발생하는 혈역학적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덱스메데토미딘(Dexmedetomidine)
덱스메데토미딘은 진정 및 진통 효과가 뛰어나며, 교감신경계 억제 작용이 있어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이 약물은 호흡 억제를 최소화하면서 부드러운 회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 리도카인(Lidocaine) 정주
기관내 삽관 제거 시 기침 반사를 억제하기 위해 리도카인을 정주(IV)로 1~1.5 mg/kg 투여하면 기관지 자극을 줄이고 부드러운 삽관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는 두개내압 상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관지 과민성이 있는 환자에서 특히 유용합니다.2) 신경학적 상태 평가 및 회복 후 감시
마취 회복 후에는 즉시 신경학적 평가를 수행하여 뇌졸중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신경학적 평가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 의식 수준(GCS, Glasgow Coma Scale) 평가
수술 후 의식 상태를 평가하여 기존 신경학적 상태와 비교해야 합니다. GCS 점수가 감소하거나, 수술 전과 비교하여 명백한 의식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신경학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운동 및 감각 기능 검사
손과 발의 움직임, 근력 저하 여부, 감각 이상 여부를 평가하여 새로운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동공 반사 검사
동공 크기 및 반사(light reflex)를 확인하여 뇌압 상승 또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언어 및 인지 기능 확인
허혈성 뇌졸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새로운 언어 장애(실어증)나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3) 수술 후 통증 관리
수술 후 통증 관리는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진통제 사용은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오이드(Opioid) 진통제는 호흡 억제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며, 가능한 한 호흡에 영향을 덜 미치는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아세트아미노펜은 신경계 부작용이 적고, 출혈 위험이 없는 진통제이므로 뇌졸중 환자에서 선호됩니다. 정맥 주사(IV) 제형을 사용할 경우 빠른 진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펜타닐(Fentanyl)
펜타닐은 혈역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진통 효과를 제공하므로 수술 후 통증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고용량 사용 시 호흡 억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용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회피
NSAIDs(예: 이부프로펜, 케토롤락 등)는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켜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뇌졸중 환자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NSAIDs 사용이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4) 수술 후 혈압 조절
뇌졸중 환자는 수술 후 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과도한 저혈압을 방지해야 하며, 출혈성 뇌졸중 환자는 고혈압이 재출혈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 허혈성 뇌졸중 환자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뇌관류가 감소하여 허혈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혈압 유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동맥압(MAP) 90~100 mmHg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혈압이 발생할 경우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이나 페닐에프린(Phenylephrine)을 저용량으로 사용하여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출혈성 뇌졸중 환자
출혈성 뇌졸중 환자는 혈압이 상승하면 출혈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동맥압(MAP) 110 mmHg 이하를 목표로 조절하며, 필요시 라베타롤(Labetalol) 또는 에스몰롤(Esmolol)과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5) 뇌부종 및 혈전 예방
수술 후 뇌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수액 조절과 항부종 치료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수액 공급은 뇌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등장성 수액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 고장성 식염수(Hypertonic saline) 및 만니톨(Mannitol) 사용
두개내압이 상승할 경우, 고장성 식염수(3% saline) 또는 만니톨을 사용하여 뇌부종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항응고제 사용
수술 후 혈전 예방을 위해 헤파린(Heparin) 또는 저분자량 헤파린(LMWH)을 고려할 수 있으나,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마취 회복 과정에서는 두개내압과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신경학적 평가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예후를 최적화하기 위해 중환자실(ICU)에서 철저한 감시와 치료가 필요하며, 개별 환자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6. 최종 결론
뇌졸중 환자의 마취 관리는 혈압과 뇌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두개내압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취제 선택부터 수술 후 회복까지 각 단계에서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마취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철저한 평가와 세심한 관리가 동반될 때, 뇌졸중 환자의 수술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응형'마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척추 측만증 수술에서의 마취: 장시간 수술 시 마취 전략 (0) 2025.04.06 소아 치과 치료에서의 진정 및 마취: 무통 치료를 위한 방법 (0) 2025.04.05 장기 이식 수술에서의 마취 관리 - 신장 이식편 (0) 2025.04.04 다발성 외상 및 응급수술 시 마취 관리 (0) 2025.04.03 간이식 수술에서의 마취 관리 (0) 2025.04.02
sol-log1 님의 블로그
sol-log1 님의 블로그 입니다. 건강, 미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드려요.